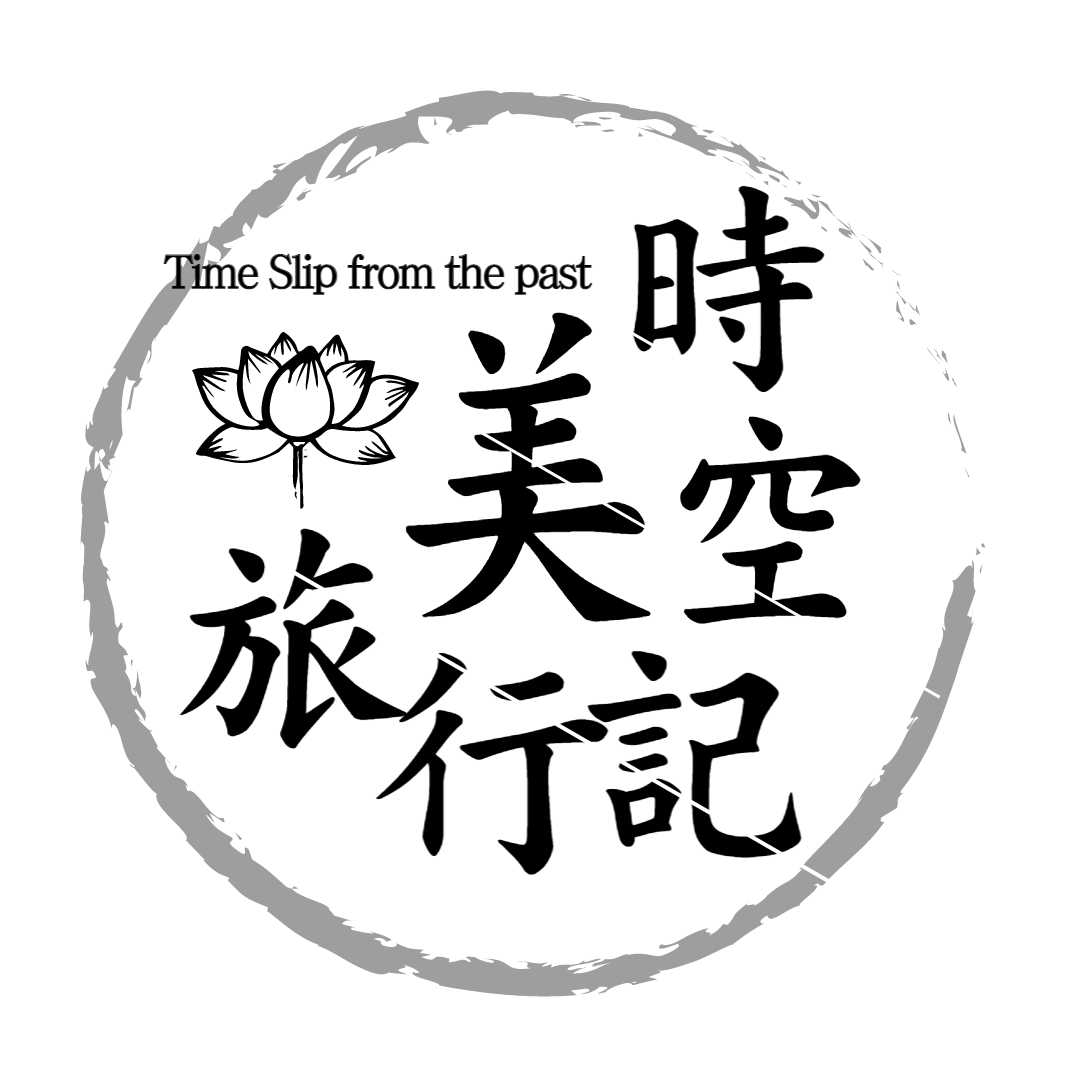어릴 적, 숫자를 배우면서 ‘1, 2, 3’이라는 숫자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사용했죠. 그런데, 때때로 이 숫자를 읽을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 "1년"은 ‘일 년’이라고 읽지만, "사과 1개"는 ‘한 개’라고 읽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 "나는 2층에 살아." → ‘이 층’
- "난 사과 2개를 샀어." → ‘두 개’
- "그 선수는 3번을 달고 뛰어." → ‘삼 번’
- "내가 빵을 3개 샀어." → ‘세 개’
같은 숫자이지만 문맥에 따라 읽는 방식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처음 접하면 꽤나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언어와 수학이 결합된 흥미로운 개념에서 비롯된 결과랍니다.
숫자가 표현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수(基數, Cardinal Number)와 서수(序數, Ordinal Number) 라는 두기지입니다.
숫자는 숫자일 뿐? 그 속에 숨은 두 가지 의미
숫자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죠. 그렇지만 숫자는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기수는 어떤 대상의 '개수'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다시말해, 기수는 우리가 물건을 세거나 양을 측정할 때 활용되는 표현이죠. 사과 1개, 2개, 3개; 책 4권, 5권, 6권; 사람 7명, 8명, 9명 처럼 우리가 ‘몇 개’라고 셀 때 쓰는 숫자가 기수입니다.
반면, 서수는 ‘순서’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1등, 2등, 3등 ; 1층, 2층, 3층 ; 1월, 2월, 3월 처럼, 사물의 개수가 아니라 '몇 번째인가'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기수와 서수를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 기수는 "개수"를 세는 숫자 → ‘한 개, 두 개, 세 개’
✔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우리가 숫자를 다르게 읽는 이유는, 같은 숫자라도 '무엇을 표현하느냐'에 따라 기수와 서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숫자 읽기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그렇다면, 이런 숫자 읽기의 차이는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수와 서수의 개념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숫자를 개수로 표현할 때와 순서로 표현할 때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기수와 서수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문자가 따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구별하는 방식이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기수를 셀 때 ‘하나, 둘, 셋’이라는 고유어 수사를 사용하고, 서수를 나타낼 때는 ‘일, 이, 삼’ 같은 한자어 수사를 주로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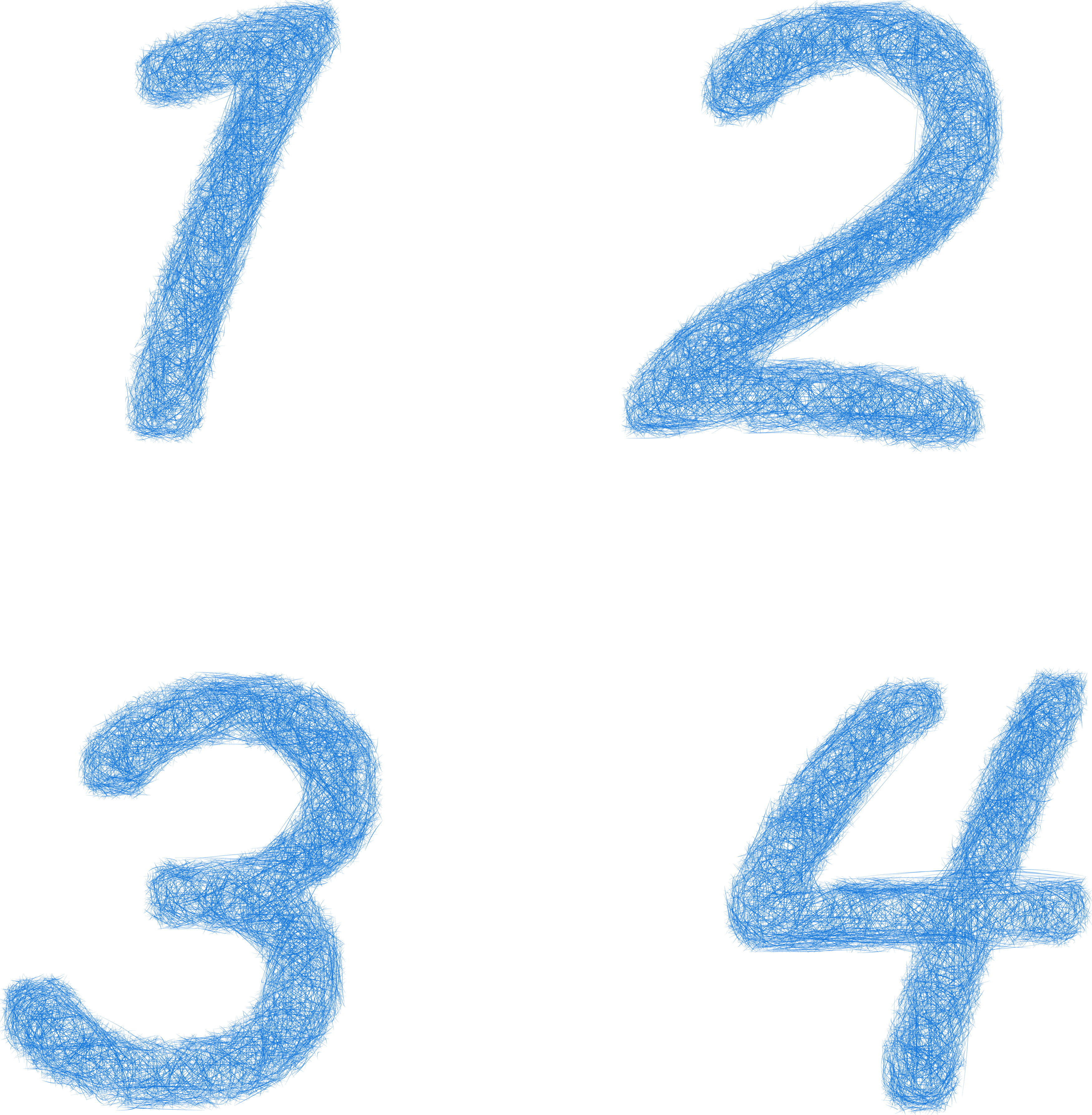
이와 달리 영어는 숫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 기수 (Cardinal Number): One, Two, Three...
- 서수 (Ordinal Number): First, Second, Third...
즉, 영어에서는 기수와 서수를 아예 다른 단어로 구분하는 것이죠.
반면, 한국어는 한 개의 숫자를 기수와 서수로 구분해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숫자 읽기 규칙이 보다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숫자는 문화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
숫자가 기수와 서수로 구분되어 쓰이는 방식은 단순한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도 반영합니다. 숫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저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특별한 상징성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 중국에서는 숫자 '8'을 행운의 숫자로 여깁니다. 발음이 '부(發, fa)'와 비슷하여 ‘부자가 된다’는 의미를 연상시키기 때문이죠.
- 서양에서는 숫자 '13'이 불길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에서는 13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한국에서는 숫자 '4'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4'는 한자어로 '사(死, 죽을 사)'와 같은 발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병원에서는 4층을 'F층'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숫자는 그 자체가 기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언어적 배경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숫자를 다르게 읽는 이유를 이해하면, 더 정확한 표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숫자를 읽을 때 기수와 서수를 구별하는 이유는 단순히 언어적인 규칙 때문이 아닙니다.
숫자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집니다.
✔ "사과 1개"를 "일 개"라고 하지 않고 "한 개"라고 읽는 이유
→ 개수를 나타내는 기수이므로 '한 개'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 "1층"을 "한 층"이 아니라 "일 층"이라고 읽는 이유
→ 건물의 층수는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이므로 '일 층'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 "나는 2번 출구로 나갈게."에서 '2번'을 "두 번"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 여기서 '2번'은 출구의 번호, 즉 기호로서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두 번'이라고 하면 '두 차례'의 의미가 되죠.
이처럼 숫자를 상황에 따라 올바르게 읽는 것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숫자의 두 얼굴: 기수와 서수의 차이
앞서 ‘1년’과 ‘한 개’의 차이를 통해 숫자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수와 서수의 차이를 비교해볼까요?
기수(基數, Cardinal Number): 개수를 나타내는 숫자
기수는 말 그대로 사물의 개수를 세는 숫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몇 개, 몇 명, 몇 마리"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숫자가 기수입니다.

기수의 예시
- 사과 1개, 2개, 3개...
- 학생 4명, 5명, 6명...
- 연필 7자루, 8자루, 9자루...
기수의 특징
✔ 대상의 양을 표현하며, 개수를 나타낸다.
✔ 한국어에서는 고유어 수사(하나, 둘, 셋...)를 사용한다.
✔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쓰인다.
서수(序數, Ordinal Number):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서수는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숫자입니다. 즉,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경우에 서수를 사용합니다.
서수의 예시
- 1등, 2등, 3등 (경쟁 순위)
- 1층, 2층, 3층 (건물의 층수)
- 1월, 2월, 3월 (시간의 순서)
서수의 특징
✔ 순서를 구분할 때 사용된다.
✔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수사(일, 이, 삼...)를 주로 사용한다.
✔ ‘몇 번째’인지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기수와 서수의 비교
기수와 서수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라고 물어보면 기수, "몇 번째?"라고 물어보면 서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 기수와 서수 비교표
| 예문 | 기수 | 서수 |
| 사과 3개 | ✅ 세 개 | ❌ 삼 개 |
| 나는 3층에 산다 | ❌ 세 층 | ✅ 삼 층 |
| 2번 선수 | ❌ 두 번 | ✅ 이 번 |
| 2번 시도했다 | ✅ 두 번 | ❌ 이 번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숫자라도 ‘몇 번째’를 뜻할 때와 ‘개수’를 셀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3층"은 ‘삼 층’으로 읽고, "사과 3개"는 ‘세 개’로 읽어야 합니다.
숫자는 언어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숫자를 읽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기수와 서수가 구분되지만, 한국어처럼 읽는 방식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 영어에서의 기수와 서수
- 기수: One, Two, Three, Four...
- 서수: First, Second, Third, Fourth...
예를 들어,
- 기수: "I have three apples." → 나는 사과 세 개를 가지고 있다.
- 서수: "I live on the third floor." → 나는 3층(세 번째 층)에 산다.
즉, 한국어와 달리 영어에서는 기수와 서수가 아예 다른 단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어는 한국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숫자를 읽습니다. 일본어에서도 기수와 서수를 구별하며, 숫자 뒤에 특정한 접미사를 붙여 기수와 서수를 나눕니다.
📌 일본어에서의 기수와 서수
- 기수: ひとつ(한 개), ふたつ(두 개), みっつ(세 개)...
- 서수: 第一 (다이이치, 첫 번째), 第二 (다이니, 두 번째)...
한국어와 유사하게, 개수를 셀 때와 순서를 나타낼 때 다른 표현을 사용하죠.
숫자의 문화적·역사적 의미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집니다.
📌 행운과 불운의 숫자
- 서양에서는 7이 행운의 숫자로 여겨집니다.
- 중국에서는 8이 부(富, 부자)와 연결되어 좋은 의미를 가집니다.
- 한국과 일본에서는 4가 ‘죽을 사(死)’와 발음이 비슷해 불길한 숫자로 인식됩니다.

📌 특별한 숫자의 의미
-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는 12가 완전한 숫자로 여겨집니다. (예: 12제자)
- 불교에서는 108번뇌가 존재하며, 절을 108번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숫자는 기수와 서수를 넘어서, 각 문화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숫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다 – 우리가 숫자를 읽는 방식의 의미
우리는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숫자를 마주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읽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의식하며 사용한 적이 있었을까요?
‘1년’은 ‘일 년’으로, ‘사과 1개’는 ‘한 개’로 읽는 이유는 우리가 숫자를 단순한 기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는 의미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기수와 서수의 차이는 숫자가 얼마나 유연하고 흥미로운 요소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
.
같은 숫자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읽어야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적 규칙이 아니라, 숫자가 지닌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숫자의 차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숫자는 단순한 셈법을 넘어, 각 문화권에서 행운을 부르는 숫자, 불길한 숫자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서양에서 7이 행운의 숫자로 여겨지고, 동아시아에서 4가 기피되는 숫자인 이유도 바로 이런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숫자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더 정확한 소통이 가능하다
숫자를 올바르게 읽는 것은 단순히 국어 문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 "나는 2번 출구로 나갈게."와 "나는 두 번 나갈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 "3층에 산다."와 "세 층을 올랐다."도 각각 순서와 개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숫자가 단순한 계산 도구가 아니라, 기수와 서수라는 개념을 통해 언어와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쓰인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숫자를 다르게 읽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한 마디도 소중하지만, 따뜻한 공감이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1시 5와 5/11분의 비밀: 시계 속 수학 이야기 (2) | 2025.05.10 |
|---|---|
| 객관식 공부법 A to Z, 문제 푸는 요령까지 싹 다 정리! (2) | 2025.05.09 |
| 사각형의 넓이 공식 A to Z: 기초 정의부터 문제 풀이까지 (0) | 2025.02.10 |
| 세제곱 곱셈 공식 완벽 정복: \((a+b)^3, (a-b)^3\) 그리고 인수분해까지” (0) | 2025.02.08 |
| 수학에서의 이상·이하·초과·미만: 부등식 개념부터 문제 풀이까지 (0) | 2025.02.08 |